
- 나무 아래 일 하는 사람들
어제 출근길에
나무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과
동남아에서 온 듯한 사람,
이렇게 둘이서 한 조가 되어
나무 아래의 공간을 확보하는
알루미늄 틀을 끼워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부자 동네인
강남의 가로수를 위해 작업을 하는 사람들.
두 사람의 고향에도 나무가 있을 것이고
나무에 대한 전설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개인적인 사연이 깃든 나무를 떠나
낯선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 고향의 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거기엔 어떤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을까.
*
며칠 전 오랫만에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a Dock of the Bay>를 들었다.
고향을 떠난 먼먼 곳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배들이 오가는 항구를 보며
힘든 몸과 마음을 쉰다는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아버지 생각이 난다.
늘 성경을 읽으셨던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자신을 말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식민지배와 그에 이어진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삶들이 많은 나라.
그 후로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여기저기로 일하러 떠났다.
독일과 중동, 그리고 수 많은 선원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 나라는 나그네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 중 두 사람이 내 눈 길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며 새겼던
나그네라는 단어가
옛 이야기 속의 낡은 단어가 아님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방문자
한국의 교회는 망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뿌리 없는 나그네의 삶을
끝없이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기 때문이다.
일찌기 여호와는 나그네의 신이었고
정착한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예수가 말하던 '지극히 작은 자'였을 것이다.
예수 탄생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휴일에도 양을 쳐야했던
가난한 목자들 같은 사람들.
일찌기 세상의 큰 힘에 굴복한
한국의 주류교회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목사가 되지 못하고
뼈를 상하며 노동을 했던 내 아버지는
그런 신께 기도했을 것이다.
*
사실, 근대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한편으로는 나그네의 시간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허물어진 공동체.
이제 우리는 익명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는
얼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게 택배를 전해 준 배달원의 얼굴을 나는 모른다.
밤새워 길을 달려 먹을 것을 싣고온
트럭 운전수를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내가 먹는 설렁탕에 얹힌
대파를 재배하는 캄보디아 소녀의 얼굴을
나는 역시 모른다.
돈은, 자본은 얼굴을 지운다.
그렇게 얼굴이 지워지면서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살아가는,
혹은 거기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
구약 성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야곱과 그의 형이 만나는 장면이다.
수십년 만에 만나는 형을 안고
동생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속에서 신의 얼굴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사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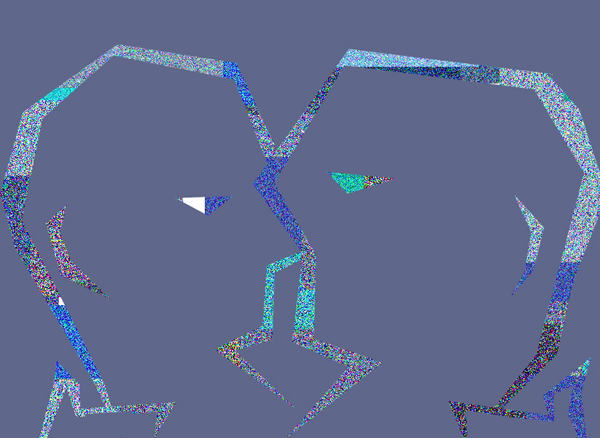
- 야곱과 에서의 재회
얼굴 없이 존재하는 나그네들도
뼈가 아픈 고통을 느끼며
소중한 것들을 품고 가혹한 시간을 견딘다.
세상은 그 삶을 끝없이 지운다.
이미지 기술자들이 만든 자본의 얼굴만
사람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된다.
사실은 나의, 우리의 얼굴도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내가 쓰는 휴대폰의 부품을 만드는 누군가도
힘들게 작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밥을 먹은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퀵을 달리는 사람도
모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을 소진하며
나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 자본화된 사회를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한 말이 떠오른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사실 우리는 얼굴 없는
수 많은 누군가의 소진되는 삶을
매일 매일 먹고 쓰는 것이다.
얼굴 없는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다.

- 최후의 만찬, Otto Dix
*
어제 출근 길에
두 사람의 작업자를 보면서
나는 그들의 고향에 있는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그들 고향의 산에는 어떤 전설이
깃들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들의 품고 있는 마음 속의
소중한 얼굴들이 궁금했다.
그들의 신화나 전설도
듣고 싶어졌다.
앞으로 그 길을 지나며
얼마간 그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다 수 많은 보행자처럼 그들을
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제 불쑥 나타나서
내게 일깨워 준 흐려가던 무엇은
계속 남을 것이다.
나그네와 얼굴이라는
내게 중요한
단어들.
*
오랫만에 치바(千葉)에 계신
작은 고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다리가 아프셔서
밀차를 밀고 다니신다고 한다.
얼굴 뵌지 10년이 넘었다.
열 다섯에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 75년.
많이 늙으셨을 것이다.
P.S.
정말 오랫만에
그림을 하나 그렸다.
<나무 아래 일하는 사람들>
손을 쉬니까 잘 그려지지 않는다.
아무튼 삽화로
올렸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